우리가 고전(古典)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그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마음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라고 쓰지, ‘실리와 명분’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다. 라면 한 그릇 끓이는데도 순서가 있듯이 언어를 사용함에도 주가 있고 종이 있다. ‘명분’이 ‘실리’ 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명분’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주지만, ‘실리’를 앞세우면 꼼수로 보여 외면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가 그러하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변이 복잡하고 매듭을 찾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 즉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논어에 『君子和而不同 (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不和 (소인동이불화)』 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지만,
소인은 서로 같은 듯 무리지어 다니지만 어울리지 못한다.”
라고 해석된다. 즉 군자는 화합하면서도 부화뇌동 하지 않지만, 소인은 부화뇌동만 할 뿐 화합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사람이 살아감에 명분(도리)에 맞으면 서로 화합 하고, 명분(도리)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부화뇌동(附和雷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이불화'(同而不和)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이 맞을 동안에만 어울릴 뿐이고, 이해가 달라질 경우 언제든지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는 뜻이다. 즉 줏대 없이 남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공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공이 많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인식 할 일이 아니다. 다양성이야 말로 발전의 동력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융창이고 민주주의이라는 명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선임강사로 1년 간 헌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 때를 회상하며 그가 한 말이다.한
“헌법을 가르칠 때, 가장 멋진 점은 다루기 힘든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 동성연애자의 권리, 차별철폐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양쪽 모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성향의 대법원 판사뿐 아니라 상대방도 설득 할 수 있어야 하죠. 이건 정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루기 힘든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을 “가장 멋진 점”이라고, 문제에 임하는 애티튜드를 표현한 그의 자세가 참으로 나이스하지 아니한가 ?
君子和而不同이란 이런 것일 것이다.
송근석/ shark@thesignaltime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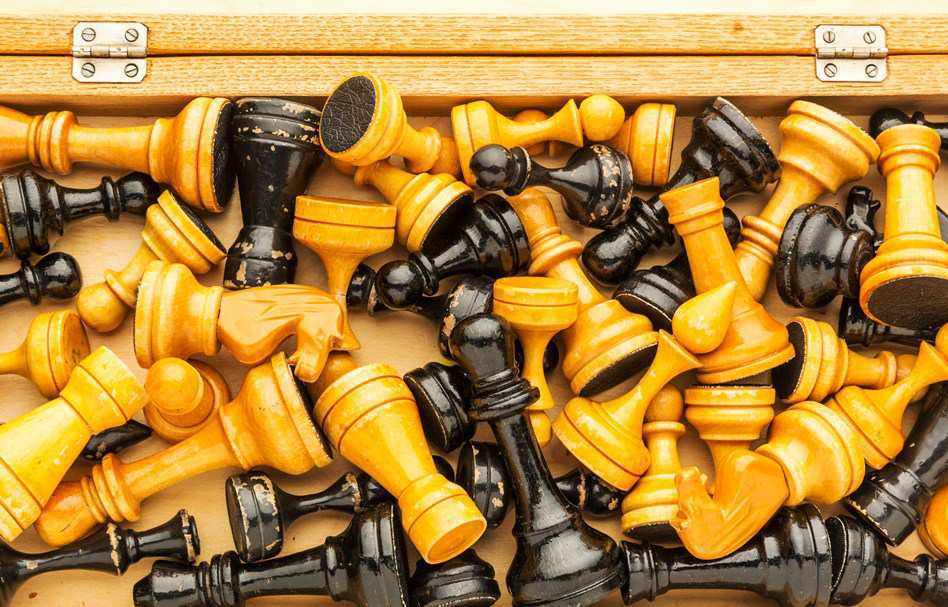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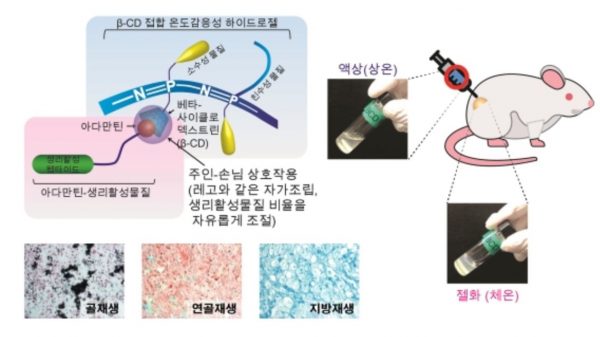
우리나라 정치가 군자화이부동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텐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