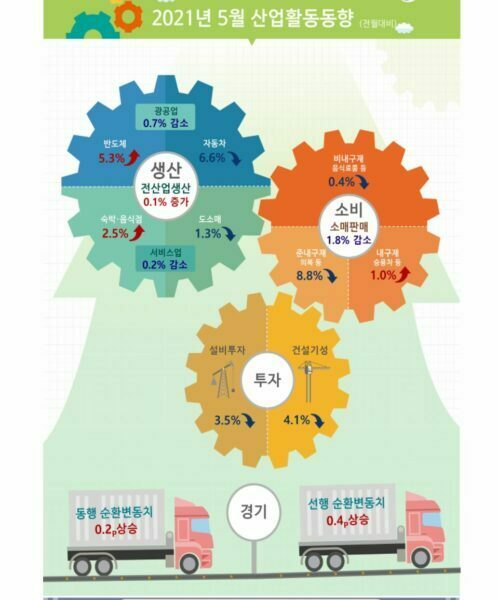♦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달러화 금태환 정지
♦ “가치저장기능”이 화폐의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
♦ 화폐는 “교환수단”으로의 실용가치가 더 유용
이런 상상을 해보자
『나는 산골로 귀촌한 사람이다. 그 산골의 마을 시장에서는 식품, 공산품, 약품 등 등 없는 게 없다. 다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만큼 가난하지만, 내다 팔게 없으면 품앗이도 해가면서 충분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 안에서는 그들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는 증서가 있다. 그 증서는 화폐와 같은 교환권이다. 그런데 우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산 너머 이웃 동네에도, 강 건너 동네에도 제 각각의 증서가 있다.
♦ 그들만의 “교환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어
나는 내가 생산한 감자를 시장에 내다 팔고 증서를 받아 그걸로 치약을 사서 쓴다. 어느 날인가는 산 너머 동네 경치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와 함께 그 곳에 가서 관광을 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통용 되는 증서를 지불하고 점심을 사먹는다. 내가 지불한 증서를 받은 식당 주인은 우리 동네에 와서 식재료를 사간다.』
이와 같이 화폐가 “교환수단”이 되므로 금화가 아니라도 유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화폐가 “가치저장수단”이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할 수만은 없다. “브레튼우즈” 체제 포기로 화폐의 금태환을 정지한 결과 가치저장기능 보다는 발행권자의 공신력이 우선시된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브레튼우즈협정” 시절로 돌아가 화폐를 금덩어리로 바꿔 준다고 해보자. 금덩어리가 밥인가 ?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긂어가면서 금송아지인들 저장해 둘 수가 있을까 ?
♦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의 문제
그러므로 가상화폐가 “가치저장수단”이 아니라는 논리만으로 폄훼하는 것은 궤변일 수 있다. 이쯤에서 경제학에서 연구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가상화폐는 현재 1,3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 많은 가상화폐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많이 선택하여 사용한 가상화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심려숙고의 결과로 어떤 가상화폐가 인정 받아 교환수단으로 사용 된다면, 정부는 그 가상화폐로도 세금도 징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정부가 징수한 세금은 그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이나 커뮤니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아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 앞서 가상화폐의 가격급등락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선걸과제가 있다. 교환수단으로서 통용되려면 가치가 안정 돼야 한다. 가상화폐 속성을 잘아는 투자자들마저 현황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봉급을 가상화폐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로써 자리를 잡으려면 가치안정이 핵심 요소인 것이다.
송근석 / shark@thesignaltimes.net